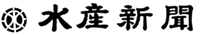바다 없는 알프스의 스위스는 해양강국이다(6월 3일)

우리는 바다가 삼면이다. 그래서 바다로 진출하기도 좋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해방이후에 바다를 통한 국가발전 전략을 택해서 역사상 중국을 추월해보는 첫 세대가 됐다. 이렇듯 바다가 있으면 우리처럼 내수 시장이 작은 국가의 경우에도 무역을 통한 국부 창출과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17세기 해양세력을 확장해 전 세계 무역을 장악했던 네덜란드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소국이었지만 바다와 조선기술 그리고 유능한 항해인력을 가장 잘 활용해 작은 국가도 강한 국가와 부국이 되는 선례를 보여주었다. 물론 그 전성기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당시의 네덜란드가 남긴 유산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 뉴욕은 원래 지명이 뉴암스테르담이었으며 공해에서의 항해 자유의 원칙이나 영해 3해리 등이 모두 네덜란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뿐인가 우리가 선원을 부를 때 사용하는 마도로스는 네덜란드의 선원을 의미하는 matroos(마트루스)에서 유래 했으며 무게를 나타내는 톤(ton)은 네덜란드 배에서 물이나 와인을 담던 나무통에서 유래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면 네덜란드가 바다에 끼친 영향은 가볍지 않다.
그런데 이렇듯 바다가 있다고 모두 해양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바다는 없지만 해양국가라 불러야 하는 나라들도 있다. 스위스는 알프스 자락의 작은 산악 국가이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국토는 작고 농업도 시원찮아서 가난한 국가였고 약소국이었다. 그러기에 로마 교황청의 근위병들은 일자리를 찾아 교황청에 용병으로 근무하는 스위스 청년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의 스위스는 전혀 다르다, 내륙에서 바다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세계 1.2위를 다투는 컨테이너 선사이자 유럽 최대의 크루즈 운영사인 MSC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대형 다국적 물류검증회사로 전세계 10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SGS의 본사도 제네바에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다가 한 뼘 없는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중의 하나인 아메리카 컵 요트 대회를 2003년 2007년 연속으로 우승했다는 사실이다. 이 아메리카 컵은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나 올림픽에 이어 축구 월드컵에 맞먹는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세계 3대 대형 스포츠 행사로 4년마다 열린다. 그런데 이 요트대회의 특징은 직전대회 우승국이 차기 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인데 스위스는 바다가 없으니 당연히 대회개최를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대회개최권을 판매했는데 바로 스페인의 발렌시아가 이를 6,000억원 이라는 거금에 사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10조원에 달한다고 하니 6,000억이 아깝지 않은 것이다. 스위스가 아메리카 컵을 우승하자 당시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가 산악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활로를 찾았다”고 기뻐했는데 바다 없는 스위스가 해양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말이 아닌가 한다. 스위스는 단순한 해양국가가 아니고 해양강국이다. 바다 없는 스위스는 이태리 제노아 항구를 빌리는 지혜와 바다를 향한 열정으로 바다가 없어도 해양강국이 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다 없는 핸디캡을 완벽하게 극복해 명실상부한 해양강국이 됐던 것이다. 발상의 전환이 보여주는 성공사례이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자락에서 태어난 해양강국이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삼면이 바디이고 해안선은 15,000키로미터이며 섬은 3,500개가 넘는다. 거기에다 동·서·남해는 바다가 보여줄 수 있는 각각의 특성을 모두 보여주는 참으로 복이 넘치는 나라이다. 이 바다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꾸어 우리가 바다의 혜택을 누린 만큼 우리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물려줘야 한다. 우리는 진정한 바다 국민, 호모 씨피엔스이다.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