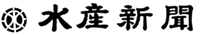박신철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上 정상을 향해
2020년 상반기는 한마디로 위축과 중단의 시기다. 아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으로 모든 산업·경제활동은 물론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위축되고 있고, 우리 수산업도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때 나이 60대에 가까운 보통 사람의 히말라야 트래킹 도전기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적고자 한다.
8박 9일간의 산행으로 목적지인 칼라파타르(해발 5650M)를 오르기까지 루크라 공항, 남체 바자르, 팡보체, 딩보체, 로부체, 고락셉으로 이어지는 수많은 과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마지막 정상 도전기와 고산지대에서의 밤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한다.

목적지인 칼라파트라는 에베레스트 정상을 바로 건너볼 수 있는 히말라야 트래킹 코스의 최고 고도이고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5300M)보다 높은 고지이다. 사실 나는 주말에 우리나라 동네 뒷산을 오를 뿐 큰 산을 오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에베레스트 정상도전의 마지막 병참기지인 고락셉 로지(5100M)까지 산소 부족으로 인한 고산병도 체력에도 별문제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신기할 정도로 적응을 잘했다. 마지막 로지를 나오니 모래 평지가 약 500M 정도 고산지대에 펼쳐진다. 바람은 불지만 편하다. 모래 평지가 끝나고 이제부터 고도를 약 600M 정도를 올리는 본격적인 언덕이 시작된다.
그런데 언덕에 들어서서 몇 걸음 걷자마자 숨이 턱 막혀온다. 직전 고도까지 없던 현상이다. 속으로 이거 보통이 아니네, 단단히 마음먹고 언덕을 오른다. 30보를 가기도 전에 숨이 막혀 이동이 안 된다. 산소가 평지의 1/2 수준이다. 20보 걷고 쉬어야겠다 마음먹고 다시 오른다. 그러나 조금이 지나지 않아 호흡이 가빠지고 숨이 막힌다. 도저히 20보를 못 채우고 또다시 언덕의 바위에서 쉰다. 아직까지 반도 못 올랐다.
앞에는 에베레스트와 주변 설산고봉들이 나를 내려 본다. 아직까지는 어깨에 배낭도 메고 있다. 다른 동료들은 이미 자신의 배낭도 가이드한테 맡긴 지 오래다. 나는 속으로 내 배낭은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걸음을 옮긴다. 한 반 정도 올랐는데 도저히 어깨의 배낭도 감당이 안 된다. 배낭을 맡기고 오를수록 바람이 날아갈 듯 거세진다. 설산 고봉에서 부는 바람이라 냉기가 옷 속을 파고든다. 몸도 가누기 힘든데 다섯 걸음을 옮기기에도 호흡이 벅차다. 정신이 아득하다. 바람 소리와 눈 덮인 바위와 끝없는 언덕뿐 이다. 언뜻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그친다. 아니다, 지금부터가 진정한 나의 한계와의 싸움이다. 나는 발걸음 가고 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마음먹고 걸음을 옮겼다.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정상이 검게 보인다. 칼라파트라는 검은 바위산이라는 의미란다.
정상이 가까워질수록 약간 경사가 완만해진다. 머리의 통증과 산소 부족의 조건에서 마침내 정상에 오른다. 물론 콧물로 인해 코가 다 헐고, 입술은 갈라지고, 개판이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내려다보며 손을 올려 정상에 선 순간, 육체적 고통과 한계를 극복한 나름의 희열이 몰려온다. 소위 지옥의 고통을 느끼고 극복해야 볼 수 있는 천상의 낙원 같은 세계가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