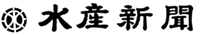양평동 칼럼/ 문영주 편집국장
수과원장 경쟁 끝나자마자 다음날 “자리 빼달라” 압박
행시 기수 물리적 조정 자리 배분 ‘기울어진 운동장’
12월이 되면 공직사회도 일반 기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정년이 되거나 명예퇴직으로 나가는 사람, 또 승진해 ‘별의 순간’을 맞는 사람들이 교차한다. 한쪽은 쓸쓸한 풍경이고 한쪽은 기쁨을 감추기 위해 표정을 관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원칙과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조직은 나가는 사람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에 아쉬움과 미련을 갖고 떠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나가는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우’를 할 때만 가능하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이 자기를 차가운 발로 내치듯이 내몰 때 아쉬움과 미련은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해양수산부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임명 발표가 나자마자 같이 경쟁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빼달라고 한 모양이다. 물론 12월에는 외부에 파견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명예퇴직하는 사람, 또 내부 인사요인을 감안해 인사를 기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공정함과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남들이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조직이 ‘갑의 입장’에 있다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사람의 입장을 재단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경쟁자들에게 수과원장 임명 발표 다음 날 곧바로 자리를 빼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논리상 아무리 그 이유가 합당하다 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행동거지가 아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발표 다음 날 경쟁자들에게 자리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말이 요청이지 듣는 사람에게는 압박과 다름없는 얘기다.
게다가 나가면 배려해 주는 자리도 국장 출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를 제안한다면 그걸 누가 받겠는가. 한 경쟁자에게는 위험물검사소장 자리를 제안한 모양이다. 이 자리는 솔직히 국장 출신 중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자리다. 또 한 사람 역시 “턱도 없는 자리”를 제안받은 모양이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과연 심정이 어떠했을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나, 내가 조직에 그렇게 누가 됐던 사람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아닌가. 감정이입을 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기분이 어떠했을까는 누구나 상상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것도 발표 후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발표 다음날 이런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오랫동안 같이 일한 동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그들은 이런 대접을 받을 바에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권리인 정년 마지막 날까지 공직자의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많다. 조직이 날 이렇게 대접하는데 내가 조직을 위해 희생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행시 35, 36기’라는 죄밖에 없다. 차관이 36기, 1급들이 36기에서 38기까지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35, 36기 국장은 공직사회 관행상 ‘빼야 할’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빼는 방법과 수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누구한테는 어디 출신이고 뒷배경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고 누구한테는 어디 출신이니까 남이 안 가는 자리를 준다면 이런 관행은 불평등을 고쳐야 할 공직사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수산·해운 편을 가르고 싶지 않지만 이미 어느 한쪽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떠나는 사람에게 동료로서, 선후배로서 따뜻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 따뜻한 배려를 할 수 있을까. 잔인한 공직사회에 12월이 가고 있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