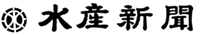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노인과 바다’의 노인처럼 앙상한 청새치 뼈만 매달고...
신문의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도 문제 노출
“수산신문도 늙은 어부처럼 다시 ‘사자꿈’ 꾸고 싶다”

시간이 활처럼이 아니라 총알처럼 간다. 벌써 17년이다. “가슴이 뜨거울 때 신문을 만들겠다”던 내가 황혼의 끝줄에 서 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은 것 같다. 이 시간 동안 수산신문은 뭐 했을까. 항상 입에 붙은 얘기지만 부끄럽기 짝이 없다. 딱히 떠오르는 게 없기 때문이다. 전문지 환경을 한번 바꿔 보겠다던 호기는 불과 2년여 만에 초토화 됐다. 오히려 자기 혼자 서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했다. 신문 내용도 그렇고 신문사 공익사업도 치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창간 이후 의욕을 가지고 시도했던 ‘전문지 리뷰’란도 1년여 만에 동종업계의 반발로 결국 ‘개점 휴업’ 중이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와의 MOU 체결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고 어업인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도 흉내만 내고 그쳤다. 당초 신문 옴부즈맨 제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은 시도만 한 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밖에 공론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참어업인을 위한 ‘올해의 수산인 상’은 아직 첫발도 내딛지 못했다.
신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성과 형평성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광고 스폰서를 무시할 수 없고 많은 독자가 있는 곳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결국 한쪽은 눈을 감고 다른 한쪽 만으로만 세상을 바라본 꼴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공정한 기사가 만들어졌겠는가.
신문의 생명은 공정한 시각으로 사실을 보도하는 게 우선이다. 이미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안에서 필요한 팩트 만을 골라 보도하는 것은 ‘용비어천가’에 다름 아니다. 또 조그만 사실을 전체인양 렌즈를 끼워 보도하는 못된 보도 행태에서 얼마나 자유스러웠는지도 의문이다. 약자에는 강하고 강자에는 약한, 하이에나 같은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권력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나약한 언론’이 과연 얼마나 공정한 기사를 내 보냈을까. 이런 환경의 시작은 수협과의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걸음마를 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걸어 다녀야 할 생태계를 수협이 뿌리째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기사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광고, 구독 등 신문사의 생명 줄을 끊어 버린 것이다. 건전한 전문지를 만들 책임이 있는 수협이 건전한 전문지 대신 순치된 전문지만 살아남게 만든 셈이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중편 소설 ‘노인과 바다’에선 이 소설의 주인공 어부 산티아고가 3일에 걸친 사투 끝에 큰 청새치를 잡는다. 그러나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가 몰려오고 노인이 혼신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청새치는 상어 떼의 밥이 된다. 결국 노인은 앙상한 청새치 뼈대만 보트에 매달고 항구에 도착한다. 항구에 돌아 와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을 기대한 노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수산신문 17년을 여기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수산신문이 산티아고처럼 청새치를 얻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사투를 벌였는지, 상어 떼로부터 청새치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산신문은 앙상한 청새치 뼈대만 매달고 온 산티아고와 같은 처지다. 당초 기대했던 꿈이 하나도 실현되지 못한 채 녹초가 된 늙은 어부처럼 수산신문은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더 이상 헤어 나올 길도 보이지 않는다. 늙은 어부와 같은 처지다. 그러나 헤밍웨이는 잠에서 깬 산티아고가 자신을 존경하는 조수 마놀린과 다시 고기잡이를 나가자고 약속한 뒤 다시 잠에 빠져 사자꿈을 꾸도록 하면서 이 소설을 끝낸다. 창간 17년, 아직도 걸음마를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수산신문도 산티아고처럼 다시 ‘사자꿈’을 꾸고 싶다. 늙은 어부를 존경하는 조수 마놀린과 같은 독자들과 함께. <문영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