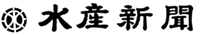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이곳은 지금 내려앉은 빛바랜 빨간 슬레이트 지붕과 흉물처럼 변한 건물 뼈대들만이
해풍 맞으며 과거의 역사 지워가고 있다"

100년 전, 호롱불을 밝혀가며 우리나라에서 처음 재래식 김을 생산한 어민들이 위판을 하기 위해 물김을 지고 길게 줄을 서 장관을 이뤘다는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평마을. 이 마을에 있는 서남해안 수협의 효시인 ‘해태어업 조합(당시)’ 건물이 수협사적 의미를 상실한 채 주인 없는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다.
김 생산어민들 행렬 장관
이 곳을 알려면 100년 전으로 거 슬러 가야한다. 한센 환자들이 살고 있는 소록도와 녹동항이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있는 신평마을은 지금은 여느 어촌과 다를 바 없 는 한적한 어촌이다. 그러나 100 년 전, 일제 강점기 때에는 김을 위판하려는 어민들의 행렬이 장관 을 이뤘으며 강아지가 5,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역경제가 번창했 던 곳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재래식 김이 생산된 곳인데다 수집 된 김이 일본 본토에 들어가던 요지였기 때문이다. 당시 김 생산 어민들은 이곳 해태조합에 위판을 하기 위해 하루 300~500명이 줄을 섰다고 했다. 이곳 마을 원로는 “호롱불로 김을 생산한 어민들이 물김을 지고 길게 줄을 섰다”며 “어 민들의 긴 줄이 장관을 이뤘다고들었다”고 당시를 전했다.

이 마을 선창 앞에는 당시를 보여주듯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어업협동조합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다. 1922년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이 건물은 대지 820평에 건평만 360평이다. 이 건물은 일본으로 김을 보내기 위해 관리직원이 상주하던 본관과 위판장, 검사장, 건조장 등으로 만들어져 있다. 100여가구 200여명이 살던 이런 조그만한 어촌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는 것은 당시 이 곳이 어떠했 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건물 입구 커다란 대리석 위에 쓰여진 ‘협동봉사’라는 글씨는 100 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100년 이상된 아름드리 향나무가 당시 영화를 말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 건물의 유래는 이렇다. 1910년 한일합병으로 ‘조선어업법’이 폐지되고 1912년 새로운 어업법이 만들어진다. 이후 일본은 해조류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 자국어업인의 한국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통로를 구축한다. 특히 김은 식용식품으로 공급이 부족한 전략 상품이었다. 이런 이유로 1918년 목가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 사람이 갯벌에 말뚝을 박아 재래식 김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22년 ‘'거금도해태조합'이 만들어진다. 생산된 김을 검사하고 건조를 한 뒤 본국에 가져가기 위해서다. 이 때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건물이다.
호롱불을 밝혀가며 김을 생산 할만큼 생산과 가공이 번창했던 이곳에 어둠이 드리우기 시작한 건 1938년. 일본인의 책동으로 어업조합이 풍양면으로 이전하고 금산어업협동조합이 발족했다. 그러다가 1972년 고흥군수협에 합병되면서 우리나라 해태 어업사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주인을 잃고 말았다.
과거 우리가 김을 어떻게 생산 했고 일본이 우리 수산물을 어떻게 수탈해 갔는지, 당시 해태어업 조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역사의 편린들을 모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이, 수협의 변천 과정에서 수협 과 어촌경제 중심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후 이 건물은 고흥군 수협이 경영을 이유로 2009년 개인에게 매도했으며 2011년 경매에 붙여졌다. 이 때 이 건물을 산 사람이 바로 홍중표 전국도매시장법인협회 회장(전 가락동 강동수산 회장)이다. 그는 이곳과 아무 관계가 없다. 수산물 유통을 위해 한 평생 전국을 다녔고 수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것외에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그는 “당시 이곳이 고향이기도 한 배 모전 수산단체장과 이모 전 농업 쪽 공사 사장이 누군가 수산인이 이 역사적인 건물을 사서 수산의 역사 를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권유에 이 건물을 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일반인이 이 건물을 사 훼손할까 봐 마음이 급했다“며 ”언젠가 수협이 이 건물을 사 수협역사관이나 김 역사관을 만들것으로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건물은 수산인과 수협이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과 수협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 있는 이곳은 지금 내려앉은 빛바랜 빨간 슬레이트 지붕과 흉물처럼 변한 건물 뼈대들만이 해풍을 맞으며 과거의 역사를 지워가고 있다.

수협 존재 스스로 부정
한 수산인은 ”역사를 외면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역사를 그냥 방치하는 건 수협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전 수협중앙회 임원도 “수협이 이를 외면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수협이 이런 현장을 수협 역사 및 문화의 장소로 활용 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곳을 수협이 매입해 수협의 어업 유산자원으로 지정하거나 김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협의 뿌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고 수협의 역사의식을 질타했다.
자기의 뿌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으며 성공해서도 안 된다. 뿌리는 자신을 지탱 하게 해주는 버팀목이다. 1918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재래식 김양식을 시작했으며 서남해안 수협의 첫 뿌리인 이 곳이 수협의 역사관으로 언제 제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