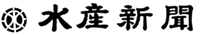박신철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下 산 속 밤의 세계
“히말라야 설산 고봉으로 둘러싸인 밤의 세계 나에겐 또 다른 고통으로”

지금까지는 육체적 이동에 의한 동적인 한계와 싸움이라면 히말라야 설산 고봉으로 둘러싸인 밤의 세계는 또 다른 고통이다.
아는 것처럼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해가 뜨는 오전은 눈밭에 복사된 태양 빛으로 눈이 시리고 따뜻한데, 해만 넘어가면 바로 냉기가 급습하는 얼음 지옥이다. 대개 로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는 로지 주인이 야크똥 연료로 난로를 피워준다. 해발 4000M 이상의 식물한계선을 넘으면 땔감이 없기 때문이다.
바람이 숭숭 통하는 로지이지만 조그마한 난로를 때는 동안에는 모든 등반객이 옹기종기 모여 유일한 온기를 마지막까지 지킨다. 그것도 난로가 꺼지고 나면 대개 저녁 20시 전후 이제부터는 각자의 방에서 밤을 지내야 한다. 방에 가기가 싫다. 왜냐면 온기라고는 하나 없고 창문에서는 바람이 술술 통하고, 침대 바닥은 냉기먹은 판자가 드러난 야생과 추위의 공간이다.
유일하게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온수로 채운 수통 하나와 침낭에 의지한 나의 체온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물론 전기는 진작 오지도 않았고, 다음날 새벽 기상까지 바로 눈앞의 물건도 보이지 않는 암흑과 추위를 견뎌야 한다.
옷을 입고 자는 것은 물론 추위를 막기 위해 털모자를 반드시 써야 한다. 심지어는 침낭을 잠그고 머리만 내어놓고 자야 하는데 이유는 방 안 공기가 너무 차가워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냉한 기운이 폐까지 전달되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불편하다. 내가 내뱉은 따스한 기운을 다시 호흡해야만 편안한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이 혹독한 암흑의 천지를 좁은 침낭 안에서 10시간을 견뎌야 한다. 불빛하나 없이 몸을 뒤척이기도 힘든 독방과도 같다고 할까!
마지막 정상을 향한 도전을 육체적 이동에 의한 난관이라면 이 침낭 속에서의 어둠은 움직임이 없는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포스트코로나 이후 이전과는 다른 세계에 와있을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기회는 있고, 모든 기회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과 같이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보는 도전이 필요한 시기다. 침낭 속 어둠을 극복하고 다음 날 아침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