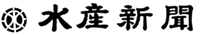신년 칼럼/ 문영주 편집국장
"미관만 중시하다 보니
실용이 실종되고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니
오히려 추해진..."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시치스럽지 않다.
이 말은 백제 온조왕의 발언으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 기록한 말이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신전을 짓고 한 말이라고 한다. ‘백제에서 궁궐이 새로 지어졌는데 그 모습이 그랬다’고 삼국사기는 전한다. 이 말은 백제의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현재 한국 문화의 현재적 대표성이라는 게 문화평론가들의 얘기다. 이후 시간이 흘러 완성된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바로 이 백제에서 비롯된 미학과 가장 일치한다고도 했다.
연말이면 받는 스트레스
연말이면 머리를 짓누르는 게 있다. 신년 컬럼이다. 신문을 만든 16년 동안 매년 이 칼럼을 써 왔다. 솔직히 새해라고 그리 특별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특별한 것처럼 포장해서 매년 꾸역꾸역 글을 쓴다. 그리고 이루지도 못할 허황된 소리를 나열한다. 솔직히 고역 중 고역이다. 새해 아침부터 아무 것도 아닌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독자를 찾아가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작년 말 대만으로 가는 크루즈선에서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전문화재청장을 만난 게 행운이었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막혔던 글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는 나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이말을 다시 끌어 올렸다. 내가 선상 강연에서 이 말을 듣고 옛날과 다르게 느꼈던 것은 그 동안 나의 삶속에 녹아 있던 ‘누추’와 ‘사치’ 때문이다. 내가 그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까닭에서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분수에 맞지 않게 살진 않았을 까. 글을 쓸 때도 뼈대는 신통치 않으면서 이런 저런 말을 차용하고 사치스런 형용사나 나열하면서 글을 쓰지는 않았을 까. 고해성사를 하는 사람처럼 이런 생각이 한 동안 머리를 맴 돌았다.
모든 사람들의 경구(警句)처럼
사실 이 말은 문화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경구처럼 담아 둬야 할 말이다. 미관만 중시하다 보니 실용이 실종되고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니 오히려 추해진 어느 건축물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화가에게는 색의 절제와 여백을, 작가에게는 당당함과 표현의 절제를 생각나게 한다. 또 보통 사람들에게도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얘기다. 집을 사는 것도, 집을 짓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정치인도 연예인도 이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이다. 추하게 행동하는 지 사치스럽게 행동하는 지가 그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신문 역시 마찬가지다. 가짜 뉴스와 황색 저널리즘이 범람하는 게 요즘 언론 환경이다. 오히려 언론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도덕관을 혼란스럽게 한다. 진영으로 나눠 갈등을 조장하고, 형평성을 잃은 채 갈등과 분열의 화신처럼 행동한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되지도 않는 기사를 만들고 사치스럽게 포장한다. 이 말은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와 경고일 수도 있다. 언론은 올바른 사실 전달이 기본사명이다. 그래야 독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된다. 가공하지 않고 담백하게 사실을 전달할 때만이 기사는 존재이유와 가치가 있다. 검소와 화려는 이럴 때 만이 진정한 빛을 발할 수 있다.
올 한해 나의 삶에 관통하기를
우리 선현들이 그렇게 오래 전에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식견과 혜안을 가졌다는 데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서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 문화를 번성시킨 선현들의 인식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런 삶을 갈구한 우리 선현들의 깨달음과 예지가 올 한해 나의 삶을 관통하기를 기대해 본다. 유홍준 전 청장은 그의 저서 7권 모두에 이 말이 관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동네 미장원 간판에서도 이 말을 쓰고 있다고도 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더욱 인생의 깊이를 생각나게 하는 이 말이 올해 모든 수산인에게 울림으로 작용하기를 기원해 본다.
문영주
ss2911@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