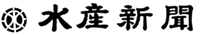김지현 기자

군산 꽃새우 파동이 품질 보장을 조건으로 일단락 된 뒤 지역 어민은 물론 전라북도와 군산시청부터 중간가공·납품업체 및 수협까지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해 사태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다.
꽃새우 중간가공업체는 고가의 광학이물선별기 도입을 검토 중이며 기계 도입 전까지 현재 3차까지 하던 선별작업을 더 늘려서라도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청은 수산물 위판장 환경개선을 위해 이미 두 차례나 보령시로 견학을 갔다 왔다. 또 어상자 재질을 나무에서 이물질 배출이 없는 플라스틱으로 교체하기 위해 규격 등을 파악 중이다. 전라북도는 50척 가량의 새우어선에 간이 이물질 선별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해망동 위판장에 광학이물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을 짜고 있다. 해당기관들의 전방위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번 파동은 새우깡 제조에 45년간 국내산 꽃새우만 사용하던 농심이 3년 전부터 미국산 비중을 늘려가다가 최근 아예 국내산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벌어졌다. 이물질 때문에 제품 생산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서해안에서는 저인망식 어업으로 꽃새우를 채취하는 까닭에 해저에 깔린 폐기물이 어망에 섞여 들어가는 비중이 높은 반면 미국은 탐지기를 동원해 새우 무리를 찾은 뒤 중간 수심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잡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물질이 적다는 것이었다. 농심은 3년 전부터 이물질 관련 품질 개선 요구를 해왔는데 개선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심의 구매 중단 선언 이후 한때 1상자에 9만원이 넘던 꽃새우 위판가격이 2만원대 후반으로 폭락했다. 급기야 흥분한 어민들이 시위에 나섰고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 지자체와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농심과 협상을 벌인 끝에 농심이 재구매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지자체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면서 사건은 훈훈하게 마무리됐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인 듯하다. 이물질 문제를 대하는 태도다.
1940년대까지 그물은 칡넝쿨이나 삼베로 만들어졌다. 이후 면사 그물이 보급됐지만 면은 바닷물에 쉽게 부식됐다. 어부들은 그물이 찢어질까 항상 살폈고 귀하게 다뤘다. 그러다가 1950년대 나일론 그물이 나오면서 어구 혁명이 일어났다. 합성섬유 그물은 질기고 가벼웠을 뿐 아니라 저렴하기까지 했다. 어민들은 그물이 엉키거나 걸리면 손쉽게 잘라서 버렸다. 나일론 낚싯줄도 마찬가지로 쉽게 버려졌다.
그렇게 버려진 낚싯줄이나 폐그물은 가라앉았고 50년간 쌓여 바닷속 지뢰가 됐다. 낚싯줄이나 폐그물이 자연 분해되는 데는 600년이 걸린다. 그리고 이런 이물질을 선별하는 비용 또한 치솟고 있다. 낚싯줄이 아주 얇고 투명하기 때문이다. 생새우는 물기가 있어 반짝거리는 탓에 육안으로 구별이 힘들다.
폐그물도 마찬가지다. 그물망이 아닌 가닥 상태의 폐그물, 1센치로 잘게 잘린 폐그물 또한 얇아 새우 더듬이와 구분이 어렵다. 고가의 레이저 선별 장비가 필요한 이유다.
국내 대표 식품회사인 농심에게 자사 제품의 품질 유지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품질 유지를 위해 택한 방법이 구입처 교체라는 것은 너무 쉬운 선택이 아닌가 싶다.
농심에게 이번 사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달라는 질문에 “어민들에게 폐그물이 적은 어장에서 조업하고, 그물 사이즈도 좀 더 굵고 크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언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지 모른다. 어민들도 관행적으로 폐어구 등을 무심코 바다에 버린 일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 사건을 딱히 누구 잘못이라고 보고 싶지 않다. 다만 어민들이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으로 대하고 있는지, 단지 수익창출과 조업의 장소로만 보고 있는지 되돌아 보는 시간이 됐으면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