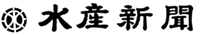창간 16주년 칼럼/문영주 편집국장
신문은 무엇으로 살까.
창간 16주년 칼럼을 쓰려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이다. 16년 간 수산신문을 만들면서 신문이 생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신문을 만들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제일 먼저 떠 오른 게 신뢰다. 독자들이 신문에 신뢰를 가질 수 없다면 신문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지금처럼 소셜 미디어로 뉴스가 유통되고 허위와 진짜 정보가 뒤섞여 독자들의 인식을 공격하는 시대에 ‘신뢰’란 신문의 생명이요, 필수적인 조건이다. 신뢰가 없는 신문이 존재할 수 있을까. 개인도 신뢰를 잃으면 공동체에서 배겨나기 어렵다. 하물며 공기인 신문이 신뢰를 잃으면 어디에도 설 수 없다는 건 불문가지다.
신뢰 없는 신문 존재할 수 없어
그럼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문의 주된 기능이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라면 먼저 ‘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기 편의대로 뉴스를 가공하지 않고 순수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권력의 눈치나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독자만을 바라보고 기사를 쓰고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소셜 미디어, 가짜 뉴스 폐해 등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는 ‘정확한 사실 보도’다.
신뢰는 또 신문의 콘텐츠를 먹고 산다. 아무리 사실 보도가 중요하다 해도 내용이 빈약하면 존재 의미가 없다. 주요 기사를 관급기사로 채우고 찌라시 정도를 가십기사로 채우는 신문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기획하고 심층 취재해 지면을 만들어야 한다. 지면을 채우기 위한 기사가 아니라 독자가 보고 싶은 기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뉴스 공급자들은 뉴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고민해야 한다. 뉴스 공급자들은 다양한 소비계층을 두고 어떤 게 가장 가치 있는 정보인지 골라야 한다. 예컨대 수산정책 정보를 원하는지, 수산물 생산 정보를 원하는지, 어촌 개발 정보를 원하는지, 어업인 복지문제를 더 원하는지 알아야 수산신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기자와 편집자가 독자들이 봐야 할 뉴스가 무엇인지 알고 양심에 따라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독자에게 전달됐을 때 비로소 신문의 신뢰는 만들어 진다.
‘힘 없는 신문, 부끄러운 신문’
그런데 수산신문은 16년간 무엇으로 살았을까.
한마디로 처참하다. 처음 신문을 만들 땐 그나마 뜨거운 가슴이 있었다. 에너지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껍데기지만 ‘정의’를 소리쳐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수산신문은 뜨거운 가슴을 잃었고 에너지도 약해졌다. ‘힘 있는 신문, 부끄럽지 않은 신문’은 ‘힘 없는 신문, 부끄러운 신문’이 됐다. 원인이야 어떻든 독자를 우롱하는 만신창이 신문이 됐던 것이다.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공감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신문의 힘이 생긴다. 그런데 수산신문은 오히려 힘 있는 소수의 대변지 노릇만 했다. 공감영역은 줄고 여론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됐다. 신문이 추구하는 방향성도 없다.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몸을 맡겼을 뿐이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기보다는 고작 겉만 훑으면서 신문이 하는 일을 다한 양 손을 놓곤 했다.
위기에 경고음도 내지 못하는 신문
그 몰골이 더는 계속돼선 안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문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더 이상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면 신문을 접는 게 맞다. 꾸역꾸역 말도 안 되는 신문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선 안 된다. 수산업이 갈수록 어렵다. 수입개방이 된 뒤 수입수산물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소리 없이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어 때문에 광어 양식업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연근해 수산물이 100만톤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할 때 어류 수입수산물은 150만톤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도 수산전문지들은 아무런 경고음도 내지 못하고 이를 외부에 전달하지도 못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수산전문지가 존재해야 하는가. 창간 16주년, 이제 그 물음에 진솔하게 답변해야 할 시기가 오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