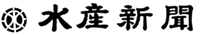문형, 어찌 그리 서둘러 떠나셨습니까?
우리가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난 지 채 두달도 안 됐는데 그날이 마지막 이별의 날이었던가요.
지난 23일 비보를 듣고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엊그제까지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설마 당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떠났습니다. 항상 웃는 듯한 당신의 큰 눈이 선합니다.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소리 없이 도움을 줬고 누가 뭐라 해도 커다란 눈으로 웃기만 했습니다. 어이가 없을 때도 “허, 참”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우리 신문사가 수협회장과 갈등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당신은 어려움을 잘 견디라며 남 몰래 회사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구독료라며 구독료 이상을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 빚을 하나도 갚지 않았는데 당신은 갔습니다.
당신은 또 자유인이었습니다. 과장 진급을 위해 본부에 들어가야 했지만 당신은 6개월 만에 난 과장이 안 돼도 좋으니까 품질검사원으로 가겠다며 본부를 나왔습니다.
이제 당신이 직접 만든 거라고 줘 사무실에 두고 있는 물고기 나무 조각에서 당신의 모습과 채취를 느껴봅니다. 우리도 이제 죽음과 익숙할 때가 됐습니다. 언젠가 우리 만나 당신이 좋아하는 막걸리를 실컷 마셔봅시다. 이런 글이라고 쓰지 않으면 마음의 빚을 갚을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편히 영면하소서. <문영주 수산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