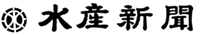창간 15주년에 부쳐/ 문영주 편집국장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주변의 냉대와 허기진 배를 쥐어 잡고도 소년은 열심히 일했다. 뭔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곧바로 그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대지주가 자기에게 쓴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소년을 아예 이곳에서 쫒아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야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됐다. 싸움의 결과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15만명의 조합원과 전국 연안시군 91개 조합을 대표하는 대지주와 단기필마의 싸움은 결과가 뻔했기 때문이다. 소년이 집을 지을 땅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년이 이곳에서 집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호의적이던 소주주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어느 지역은 지주회의를 열고 통째로 이 소년을 거부했다.
이 싸움은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다. 지주 하수인들은 어떻게든지 이 소년을 쫒아내려고 틈만 나면 관계 당국에 중재를 요청하고 민·형사 소송을 걸어 소년을 괴롭혔다. 사람을 쓸 여유가 없어 혼자서 모든 일을 해야 했던 소년은 한 손엔 펜을, 한 손엔 소송 서류를 들고 밤을 새우기 일쑤였다. 이런 싸움은 무려 7년간이나 계속됐다.
전쟁은 끝났다. 그에게 남은 것은 전쟁 폐허와 피로감뿐이었다. 과거 호의적이던 사람들을 찾아 다시 협조를 요청했지만 7년이란 세월은 짧지가 않았다. 그는 다시 맨손으로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리고 3년. 소년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고 반짝거려할 눈에는 돋보기가 걸려 있다. 정말 근사한 집을 짓겠다던 소년의 야망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아른 거릴 뿐이었다. 맑고 신선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어둡고 더러운 것은 걷어 내겠다던 소년의 야망은 그렇게 꺾여 갔다.
‘7년 전쟁’ 후 남은 것은?
15살이면 아무리 조숙한 사회라 해도 맑은 영혼이 지배하는 나이다. 순수하고 꿈이 있는 나이다. 4계절로 치면 봄의 초입에 들어서는 나이다. 연두 빛 물감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새 순이 돋아나는 가지를 꺾기엔 너무 잔인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계절이다.
그러나 15살 소년은 얼굴도 마음도 이미 늙어버렸다.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지금 소년은 기로에 서 있다. 땅을 일궈 집을 지을 것인지, 집 짓는 것을 포기할 건지 고민에 쌓여 있다. 혼자 힘으로는 거대한 집을 지을 수 없는데도 혼자서 톱과 망치만을 들고 집을 짓겠다는 게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안타깝지만 15살에 요절할 건지, 아님 꾸역꾸역 그냥 삽질이나 하며 집 짓는 흉내만 낼 건지, 아님 크레인을 동원해 굉음을 내며 집다운 집을 짓기 위한 공사를 한번 시작해 볼 건지 소년의 머리가 복잡하다.
소년은 옛날엔 밤 새워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너무 체력을 가불해서 쓴 탓인지 몇 시간만 잠이 부족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천근만근 몸이 무거워진다. 15살 소년이 겪기엔 너무 힘든 여정이었던 모양이다.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인지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이 수시로 든다. 목적을 잃은 것인가. 고생해도 멋진 집을 지을 것 같지 않다는 불안감이 온 몸을 감돈다. 절망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위로를 건네던 사람도 줄고 있다. 지금 소년은 이렇게 길을 잃고 다시 황량한 벌판에 서 있다.
한강의 책 읽을 수 있을까
15년 전 수산신문이 내건 ‘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신문’을 만들겠다던 약속은 지금 빛바랜 구호가 돼 허공에 걸려 있다. 수산인들에게 수산신문 주식을 한 주라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신문을 만들겠다던 다짐 역시 낙선자의 벽보처럼 의미없는 공약이 돼 햇빛과 비바람에 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수산신문은 소년처럼 황량한 벌판에서 다시 길을 떠날 차비를 하고 있다. 힘들지만 아직은 가야할 데가 있어서다.
몇달 전 서점에서 사 온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그냥 책장에 박제품처럼 꽂혀 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장식품으로 만들었던 그 책을 이번 특집이 끝나면 한번 읽어볼 생각이다. 하지만 생각대로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최근에는 한번도 이런 약속을 지켜 본적이 없기 때문이다. 천생 여름휴가 때나 읽어 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지 않은 기분 나쁜 예감이 먼저 찾아온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는 가장 중요한 계약이다. 히틀러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좋다”고도 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도 말랬는데 수산신문의 거창한 약속은 언제나 지켜질 지…. 창간 15주년에 느끼는 소회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