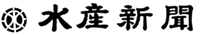창간 14주년에 부쳐/문영주 수산신문 편집국장

그러나 그럴수록 호기가 발동했다. 퇴직금으로 영등포구 당산동에 조그만 사무실을 얻고 편집기자 한명과 둘이서 창간 작업을 시작했다. 창간호 편집계획을 세우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뛰었다. 우려 섞인 시선과 기대가 교차했다. 배를 사 첫 출항에 나서는 선주처럼 가슴이 뛰었다. 그러고 보니 14년 전은 가슴이 뛰는 청춘이었나 보다.
인터뷰와 외부 취재가 어느 정도 끝나 창간호 골격이 나왔을 때 난 창간사를 썼다. 새벽 4시 대부분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난 왜 신문을 만들려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소박한 꿈을 얘기했다. ‘일필휘지(一筆揮之)’였다. 꾸밀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려 섞인 시선과 기대 교차
그러나 벽은 두꺼웠다. 사돈이 논을 산 것도 아닌데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았다. 일부 동업지의 견제도 그랬다. 본지 일부 기사에 시비를 걸고 반회유성, 반협박성 전화를 걸기도 했다. 우리는 창간 후 매주 ‘수산전문지 리뷰란’이라는 고정란을 만들어 전문지 기사를 분석하고 보도 행태를 기사화했다. 이 기사를 두고 시비가 계속됐다. 쓰지 말라는 부탁에서부터 계속 이런 기사를 쓰면 고소하겠다는 동업자도 생겼다. 아마 그들은 ‘수산신문’이란 싹을 키우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복병은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 수협중앙회와의 ‘7년 전쟁’이 그것이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갓난아기에게 수협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였다. 신문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와 구독부수를 쥐고 있는데다 규모가 커 애초 우리 싸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이종구 수협중앙회장과 장병구 수협은행 대표는 중앙회 부장들의 초청으로 가야산 등산을 간다. 거기서 장병구 대표가 폭탄주를 마시고 ‘조합장 폄하 발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수산신문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엉뚱하게 수산신문의 발목을 잡았다. 우리 신문 논조가 중앙회 집행부가 바라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신문 경영을 위해서라면 장병구 대표가 탄핵(?)을 당하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홍보실의 협조 요청을 무시했다. 절차와 당위가 실종됐다는 판단에서였다. 중앙회는 물론이고 일부 일선 수협도 중앙회 권유에 따라 신문 구독을 거절했다. 어떤 지역은 조합장 협의회 결정 사항이라며 그 지역 전 조합이 신문 구독을 끊기도 했다. “잘 알 것 아니냐. 미안하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조합장이 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검찰과 법정을 거쳐 사건이 종결된다. 당연히 수산신문의 승소였다. 그러나 우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7년 가까이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됐기 때문이다. 성장이 멈춘 암흑기였다.
성장 멈춘 암흑기를 보내고
솔직히 말해 수산신문은 지금 살아있는 것만도 대견하다. 군비도 없으면서 신문사 창간 후 절반 가까운 시간 전쟁을 했으니 신문사가 건재 하는 것만도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신문을 적당히 만드는 구실이 되거나 변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신문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독자들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양질의 정보 제공 없는 신문은 또 존재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는 수산신문의 어두운 자화상을 본다. 창간 때 약속처럼 편집국에 많은 기자들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독자가 신문을 기다라는 그런 신문을 만들고 있는지, 관급 기사로 지면을 채우고 차별화도 안 되는 그런 신문을 만들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지는 않은지, 권력 앞에선 한쪽 눈을 감고 약한 자에겐 정도를 지키는 척하는 비겁한 신문은 아닌지 자문한다.
14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다. 에너지가 충만하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가져야 할 나이다. 그런데도 우린 아직도 혼자 힘으로 하늘을 날지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간절함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아직도 우리 간절함이 부족해서 일까.
아직도 간절함 부족한 것인지
얼마 전 트래킹을 하기 위해 네팔 정부마저 등산 허가를 내 주지 않는다는 다울라기리산 제1봉(8,078m)이 보이는 산장에 머문 적이 있다. 그 산장은 해발 2,050m에 위치해 있었지만 별로 산행을 해보지 못한 나에게는 벅찬 일정이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올려다보면 도저히 허락할 갈 것 같지 않는 그 산을 그래도 나는 올랐다. 위를 쳐다보지 않고 한발 한발 내딛는 발만 보고 걸었기 때문이다.
창간 14주년, 수산신문은 좌절의 시기를 벗어 던지고 한발 한발 정상을 향해 다시 산행을 시작하겠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신문사를 만든다고 하니까 써 주신 정언(正言), 정심(正心), 정행(正行)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