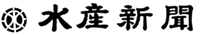매주 기사 꼼꼼히 체크 문제 있다 싶으면 바로 전화
때론 격려 전화하며 기자 본분 잊지 않게 해
어선협회(현 선박안전관리공단) 홍보실장 출신 '매의 눈'

신문사 전화벨이 울린다.
“수산신문이죠. 거기 문 국장(편집국장) 있어요”
“누구시죠?” “나 오영조라는 사람인데…”
“네. 잠깐요”
직원이 전화를 바꾸자
“문 국장 잘 있어. 요즘 어때”
“그저 그렇죠”
“근데 요즘 신문에 신경 안 쓰나 봐”
또 뭔가 잘못됐나 보다. 섬뜩하다.
“왜 뭐가 잘못됐나요?”
“신문 좀 잘 만들어. 이것 제목 틀렸잖아. 내가 지금 신문 보고 있는데 수산자원 인데 수자원이라고 돼 있고…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는 신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어김없이 잡아낸다.
또 어떤 때는 전화를 걸어와
“아, 그 기사는 아주 잘 썼어. 역시 문 국장이야. 내가 언제 가서 기자들한테 밥 한끼 살 께”
현재 사당동에서 영일만 이라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오영조(75)사장. 뭐 이런 투다. 신문사 편집국장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그는 유별나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의 전화를 공손히 받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는 수산신문 열혈독자다. 또 그는 수산신문 창간 후 지금까지 수산신문을 보고 느낀 것을 가감없이 얘기한다. 수산신문에 대한 각별한 정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는 1968년 수산청에 입사해 어촌지도와 기술 보급을 위해 시청각 제작을 하는 곳에서 일했다. 그러니까 딱 50년 전이다. 그러다 1980년 어선협회(현 선박안전기술공단)로 자리를 옮긴 후 홍보파트에서만 20년을 근무했다. 2000년 퇴직 후 제2 인생을 시작한 게 바로 여기 막횟집이다. 그는 “체력에 자신도 있었고, 아버지가 어선어업을 했기 때문에 회라면 자신이 있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오지랖이 넓고 붙임성이 좋아 당시 수산계에선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다. 기자가 어선협회에 출입할 당시 문제가 있는 기사가 나오면 그는 집에까지 찾아와 이렇게 얘기한다. “기사를 빼 달라는 게 아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겠다” 뭐 이런식이다.
그의 가게는 사당동에서 유명한 식당이다. 배와 야채에 오징어 등을 넣고 만든 막회와 광어 가자미회 등을 파는데 술 취한 손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 술집인데 맨 정신으로 온 사람 먹고 가라는 얘기다. 또 소주도 남자는 1인당 1병반, 여자는 1병으로 제한한다. 독특한 경영방식이다. 공간이 넓지 않은데 술주정을 하면 옆사람이 피곤해서란다. 또 술이 취하면 신도 바꿔 신고 화장실에서 부딪히는 등 시비가 생긴다는 것. 그런데도 저녁 술시가 되면 그의 집은 앉을 자리가 없다. 맛있고 싸고, 영감이 괴팍스럽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명집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인지 KBS, MBC, SBS 등 공중파는 물론 조선일보, 주간조선, 심지어 일본음식잡지 까지 찾아와 취재를 한다.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경, 7~8명의 여자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서려 하자 그는 “아주머니는 술을 드셨구만요. 나중에 오세요”하며 돌려보낸다. 희한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자꾸 뒤를 돌아본다. 한 사람이 적어도 1만원어치만 먹는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인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그는 평소 오후 4시 준비를 하고 5시 출근해 10시에 퇴근한다. 유명세 덕분에 돈도 좀 벌었다. 오늘은 취재를 온다고 하니까 한 두시간 정도 일찍 나온 셈이다. 그는 식당이 다소 한산하자 수산신문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다. “수산신문을 처음 봤을 때 참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즘 신선함이 좀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아픈 곳을 찌르기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신문이 도착하면 꼼꼼히 본다.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려야 하는 데 아직도 오·탈자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어떤 것은 소제목이 헷갈리고…”
내친 김에 갈 데까지 갈 모양이다.
“비교적 다른 신문보다 정부 정책을 많이 비판하는 것 같지만 아직도 멀었다. 비판하려면 좀 더 과감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어민들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신문이 대변해 줘야 하는 데 현장 기사가 많지 않다. 또 과거 OB들 소식도 실어야 한다. 신문의 역할을 매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수산신문은 싹수를 봐서는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 텐데 수협과 싸우면서 성장이 둔해진 것 같다”며 “85점 정도는 주고 싶다”고 했다.
관심과 애정을 포기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성숙한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가 식당을 연지 17년, 수산신문이 신문을 창간한지 14년. 그는 성공했고 수산신문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