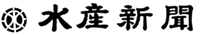문영주 편집국장
나이 드니까 한해 가는 게 예사롭지 않다. 故천상병 시인은 ‘귀천(歸天)’이란 시에서 자기를 하늘에서 이승으로 소풍 나온 사람으로 비유했다. 그리고 머잖아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각 연의 초행을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로 시작한다.
해 지면 하늘로 돌아간다면 나도 이제 일몰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난 자꾸 뒤를 돌아본다. 내가 그 동안 제대로 걸어 왔는지, 방향이 맞는 건지, 남에게 못된 짓은 하지 않았는지, 부질없는 생각을 하면서 세밑을 간다. 고해성사가 자꾸 하고 싶을 걸 보니 나이를 먹긴 먹은 모양이다.
수산신문도 태어난 지 어느 새 14년이 지났다. 신문의 청춘이 몇 년인지 모른다. 그러나 수산신문은 아직도 어리거나, 아주 늙어버렸거나 둘 중의 하나는 분명한 것 같다. 신문에 반짝이는 예지도 보이지 않고 일상을 뉴스처럼 만들며 거기서 데면데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청춘은 아닌 것 같다. 청춘은 불의를 보면 끓어오르는 게 있어야 할테니까 말이다.
고해성사가 자꾸 하고 싶은 걸 보니
올해 수산계를 되 돌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노량진수산시장이다. 수협이 정부 돈과 자기 돈 2,200여억원을 들여 3년간 공들여 시장을 지어 놨는데 상인들은 새 시장에 들어가기 싫다고 한다. 새 것으로 이사 가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일진데 왜 그들은 새 시장을 거부할까. 지금 시장은 마치 삼팔선 같다. 새 시장으로 이사하기 싫다는 사람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시장을 지어 놓고 들어오라는 사람은 법원의 명도소송에 매달려 있다. 시장에 들어오는 입구는 마치 다른 나라 입국장처럼 안내하는 사람도, 출입구도 다르다. 나 같으면 염장이 터질 것 같은데 시장을 지어 놓은 사람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 아니기 때문일까.
어쨌든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돼도 부족할 판에 2개의 시장으로 쪼개져 있고 상인들 마음도 흩어져 있다. 국제사회 같으면 이런 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 드는 국제기구도 있을 텐데 시장엔 유엔도 없다. 정부도 수협도 뒷짐만 지고 ‘피박’을 쓰지 않기 위해 면피하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피 터지게 싸우거나, 버티는 게 이긴다는 걸 가르쳐 줄 모양이다. 이런 상황은 대선정국에 들어서면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과 어민들 돈으로 지어진 시장은 끝이 어딘 줄도 모르고 가게 될 것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도 마찬가지다. 여기가 우리 영해인지 중국 영해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서 떼 지어 몰려다닌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중국어선 꽁무니만 쫓아 다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오죽하면 지난 6월 연평도 어민들이 직접 중국어선을 나포했겠는가. 그런 뒤에야 정부는 7월 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대책 및 서해5도 어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해 NLL 부근에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국민안전처에 신설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조업 담보금을 2억에서 3억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연평도 인근에 특공대 2개팀을 상주 배치하고 공용화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중국 어선이 우리 수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어업인은 별로 없다. 우리나라 정국이 안정되고 다시 중국과 협력관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정부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밀어내는 데만 급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올해는 수산계에 별스런 일도 다 벌어졌다. 환경부는 지난 5월 23일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실험결과 고등어구이가 미세먼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인 것처럼 발표했다. 어업인 및 수산인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결국 환경부가 해명자료를 내 불을 끄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산인들은 정신적 금전적 손해를 봤다. 오죽하면 수산계에서 ‘수산인들이 봉(鳳)’이냐는 얘기가 나왔겠는가.
또 폭염으로 전복과 어류가 집단 폐사하는 등 올해는 자연마저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이 같은 기후 변화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른다. 이 밖에도 수협은행 분리, 한· 일어업협상 결렬 등 올해 수산계는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한 여정을 걸어 왔다.
서로 다른 나라처럼 시장은 쪼개지고
그 과정에서 수산신문은 어떤 일을 했을까. 현상을 심층 취재해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했을까. 부끄럽게도 수산신문은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부의 발표만, 어업인들의 모습만 전달하는 데 그쳤다. 전문지 다운 전문성은 어디론가 실종되고 기자는 현장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채 방관자로 전락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4일 최순실의 테블릿PC가 발견되고 난 뒤 불과 두달도 안 돼 대통령 탄핵 등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 병신년(丙申年)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수산신문의 초라한 몰골이 제대로 보일 리 없다. 2016년 병신년, 수산신문의 초라한 몰골이 그 나마 대형사고에 묻혀 지나가고 있다. 한해 세월의 강을 건너는 수산신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문영주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