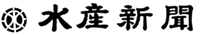“수협 어민 마지막 희망이고 기대…그걸 생각하면 수협 사람들 잠자선 안 돼”
“내가 좌판 벌여서라도 어민들 잡은 수산물 팔아 드릴 테니 꽃게 보내라”
“어민 고기 잡고 수협은 고기 팔아 주는 곳…수

지난 22일 저녁, 회장 취임 후 첫 어업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백령도에 온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에게 어민들은 꽃게를 잡아도 팔 데가 없다며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럼 꽃게를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라이(고무 대야)에 넣어 살리고 있습니다”
순간 김 회장 미간(眉間)의 골이 깊어졌다.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 팔 데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민들은 고기 잡고 수협은 그것을 팔아 주는 데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책임지고 팔아 줄 테니까 저에게 보내십쇼” 김 회장 얼굴은 평시로 돌아 왔지만 목소리는 가라 앉아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좌판을 벌여서라도 팔아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꼭 보내라”는 말을 몇 번이고 했다. “수협이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흔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수협이 어민들 잡은 고기를 못 팔아 줘서야…”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코리아 킹(534톤)’이 인천항을 소리 없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하늘은 파랗고 바다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미동도 없었다. 회장 취임 후 첫 어업현장을 찾는 김 회장과 일행을 태운 배가 백령도를 향해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김 회장에게 바다는 낯선 데가 아니다. 태어난 곳도 바닷가(남해)고 대학도 수산대학을 다녔다. 대학을 졸업한 후 1년 가까이 배를 타기도 했으며 아직도 어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 온 셈이다. 그가 회장 선거 때 만든 동영상의 ‘할아버지의 바다, 아버지의 바다, 아들의 바다’가 바로 이곳인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선실 유리창에 들어오는 바다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수학여행을 떠나는 어린 아이처럼 그의 눈은 초롱초롱했다.
배가 항내를 빠져 나가자 간간이 어선과 여기저기 부자와 어구 같은 것이 보였다.
“저게 무슨 어구입니까?”
김 회장이 동행한 장경호 옹진수협 조합장에게 물었다.
“닻자망입니다”
“그래요. 또 이곳에서는 낭장망도 합니까? 그런 조업은 그물이 모기장 같아서 어린 고기들이 많이 잡힐 텐데…”
그는 걱정스러운 듯 말을 계속했다.
“어초 투하하고 고기 방류하면 뭐 합니까”
말 꼬리에 악센트를 주는 김 회장 특유의 억양이 나왔다.
“어린 고기 잡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린 고기를 잡는 어선을 그대로 놔두고 자원관리 한다고 치어방류하고 어초 투하한 들 효과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선을 감척하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 정부의 자원관리 정책은 순서가 잘못돼 있습니다”
아마 김 회장 만큼 현장을 잘 아는 어업인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대학서 체계적인 공부도 한데다 현장도 체험했고 어업까지 하고 있으니 그의 눈에는 수산이 보이는 모양이다. 만약 그가 수협회장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쳐갔다. 자원 얘기가 나오니까 그의 말은 자연스럽게 중국 어선으로 넘어갔다.
“중국어선 잡아먹으라고 치어 뿌립니까? 중국 정부는 우리 어선이 중국 수역에 들어가면 지금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정부는 어민들이 여기가 우리 영토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다 나중에 안방까지 내 줄 겁니까?”
수행한 수협 직원들은 새벽에 일어난 탓인지 잠시 눈을 부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백령도까지 가는 4시간 동안 한시도 눈을 부치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고 수산 얘기를 계속했다. 바다를 바라보면 이제 신물이 날 것도 같았지만 그에게 바다는 항상 새로운 세계인 모양이다.
“치어 방류하고 인공 어초 투하하면 뭘 해”
그는 연평도에 내리자마자 해경 초소를 방문했다.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어민들을 잘 보살펴줘 고맙다. 어민들을 잘 부탁한다”고 했다. 마치 아들을 남의 집에 맡겨 놓은 아버지처럼 그는 행동했다. 그러면서 순경들에게 일일이 명함을 건네줬다. 우리 어민들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에서다. 백령면사무소에서도 그랬다. 이어 해병 여단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중국어선 우리 수역 침범 문제와 우리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조업구역 확장 등에 대해 여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까나리 액젓 공장을 둘러본 자리에서는 수협홈쇼핑에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회 간부에게 지시했다.
저녁 식사와 함께 시작한 백령도 어업인과 간담회에서 어민들은 앞서 얘기한 수산물 판로 이외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과 조업구역 확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우리 어민보다 중국 어선을 지켜주고 있다”, “우리 어선은 조업을 못하고 중국어선은 조업을 하는 데 그게 중국 땅이지 우리 땅이냐” , “대청도는 중국에 임대 줬다고 봐야 한다”
중국 어선 얘기가 나오자 어민들 입에서 험한 얘기가 계속 터져 나왔다. 그러면서 “중국어선들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밤에 대청도에 해경경비정을 상주시켜 달라”, “중국 어선 나포 시 받은 벌금을 그 지역 어민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했다. “조업구역도 38도2분까지는 올려줘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묵묵히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만나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다. 회장의 권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꽃게 판로 문제는 달랐다. 그는 어민들이 "꽃게를 못팔고 있다"고 하자 “팔지 못하면 꽃게를 모두 나한테 보내라”며 “내가 좌판을 벌여서라도 반드시 팔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수협의 존재이유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는 “수협이 어민이 잡아 온 것을 팔아주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곁에 회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그의 이런 ‘분노’는 간담회가 끝난 후에도 이어졌다. 그는 기자와 만나 “회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잘 안 된다”며 “수협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협이 뭣 하는 조직인지 정체성에 대해 조직이 얼마나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또 “병들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는 병들어 있으면서 아픈 줄 모르는 게 문제”라며 “조직이 어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지, 어민이 조직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면 조직은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고 조직의 각성을 지적했다.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자금을 받으면서 체결한 MOU는 일종의 노비문서입니다. 그런 종 놀이가 어민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며 “종으로 계속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조직의 심각한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일이 피곤한 건 아닌데 능력의 한계를 느낀다”며 “때를 기다리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아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했다.
“엄격히 따지면 지금 수협의 문제는 바젤Ⅲ, 수협구조 개선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 하나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원들의 근본적인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수협은 어민의 마지막 희망이고 기대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수협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그는 23일에도 대청도와 소청도를 찾아 가 어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얘기를 경청했다. 그는 2시10분 인천으로 가는 여객선 ‘코리아 킹’을 다시 탔다. 장경호 옹진수협 조합장은 “첫 방문지로 이곳을 찾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며 “어민들이 회장님의 격의 없는 대화를 듣고 칭찬이 자자하다”고 어민들 말을 전했다.
그리고 5시30분, 김 회장은 인천항에 내리자마자 대기해 있던 승용차를 타고 쏜살같이 여객터미널을 빠져 나갔다. 저녁 8시30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수산과 협동조합에 관한 특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한 사람들의 피곤한 몸이 집을 향할 때 김 회장의 차는 신림동 서울대 캠퍼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 신천동 수협중앙회는 거대한 괴물처럼 밖에서 부는 세찬 바람을 외면한 채 어둠 속에 몸을 감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 회장은 그 다음날 다시 거문도 어민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떠났다. 그리고 이틀 후 김 회장은 빗속에서 거문도를 방문한 뒤 다시 '새로운 일'이 기다리는 서울로 돌아 왔다. <문영주>